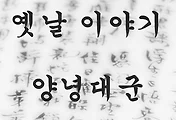안동고을에 찢어지게 못사는 모녀가 살았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지 여러 해가 되니 집안 꼴이야 말할 수 없게 되고 관가에서 삼천 량이나 되는 돈을 꾸어 빚방석에 앉게 되었다.
어린 달래가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면서 단 얼마라도 어머니의 약값에 보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지만 큰 보탬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 얼마 전의 일이다.
갑자기 달래네 고을에 나라에서 보낸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라면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고을에서 일어나는 대소 송사와 재정문제 등을 다스렸는데 안동부사는 암행어사가 내려 온다는 말에 즉시로 달래네 집에 군졸을 보내어 삼천 냥의 빚을 아무날 아무시까지 갚도록 하라고 전갈을 했던 것이다.
당시 포흠 천 량을 갚지 못하면 국법에 의해 사행에 처하게 되어있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달래네는 별 수 없이 죽는 날을 기다려야 했다.
이래서 시작된 게 달래의 소금장수였다.
『소금사려! 소금이요!』
그러나 소금장수를 한다해서 그 많은 포흠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막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달래의 처지를 동정하여 소금을 약간씩 사 주기는 했지만 하루 이틀에 모아 절리도 없는 포흠 빚이고 보면 소금을 파는 동네 사람 쪽이나 답답한 마음은 별다를 바 없었다.
『가엾어라! 늙은 어미 병구환 하느라고 삼천 냥 빚을 지고 저러구 다니니 이제 암행어사가 내려오면 무슨 변이 나고 말걸 쯧쯧쯧!』
이렇게들 가엾어하고 동정하긴 했지만 자고로 세상 인심이란 자기가 앓는 감기가 남이 죽는 것보다 더한 법이라 노름에서 몇십 냥, 몇 백 냥씩 잃기는 하면서도 달래네 빚을 덜어줄 생각을 않는 동네 사람들이었다.
이럴 즈음 안동 고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젊은이가 한 사람 있었다.
이 젊은이는 세상이 다 아는 부랑자였다.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지 못하는 성미에다가 성질이 게을러빠지고 싸움을 좋아해서 나이 서른이 돼 가건만 결혼도 못하고 부평초모냥 사시사철을 떠돌이 신세로 다니며 사는 그런 사나이었다.
아무 곳이나 들어 누우면 자기집 안방이란 식으로 아무 주막에서나 유하고 걸핏하면 주막집 안주인을 겁탈하기가 일쑤요 그렇잖으면 동네 유부녀를 유혹하는게 일이어서 사람들이 송충이 모냥 싫어했지만 얼굴 하나는 미끈하고 허우대가 헌출한데다 기운이 장사이고 보니 아무나 함부로 내들 수 있는 형편도 못되었다.
어쨌든 이 부랑자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오늘은 발걸음을 안동으로 향했던 것이다.
한참을 오던 부랑자는 주막이 있는 거리에 당도하자 갑자기 시장기를 느꼈던지 부시럭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엽전 열 잎이 잽혔다. 그게 총 재산인 모양이다.
『젠장 열잎 밖에 없구먼!』
부랑자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막걸리 오푼어치를 시켜놓고 보니 이 이상 시켜 먹었다가는 나중에 고생 꽤나 하게 되었던 모양인지
『에라 오푼은 쓰지 말고 아껴 두어야겠다. 나중에 정 시장하면 주모에게 적당이 둘러처서 오푼을 주고 열푼을 꾸어야 되겠구나.』하고 꿍꿍이를 해 보기까지 하는 부랑자였다.
그런데 이때 풍신 좋은 백발노인 한사람이 주점 안으로 선뜻 들어서며
『어 시장하다!』하면서 두리번거리며 주막 안을 훑어보는 듯 하더니 부랑자를 한동안 바라보고는 그의 옆 빈자리로 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부랑자를 향해 숙기 좋게 말을 걸어오는게 아닌가--
『여보게 젊은이 나 술 한잔 사 주구려! 뱃속은 출출한데 돈 가진게 없구먼!』
『허허허 노인께선 어찌 그리 농담도 좋아하시요! 마침 나는 가진게 없으니 안되었읍니다.』
부랑자는 기막힌 사람 다 보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한 즉 노인은
『아니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당신 방금 오푼 어치 술을 사 먹고 주머니 안에 아직도 오푼이 남아 있을 텐데. 너무 이 늙은이를 조롱하는구려』 하며 어서 술을 사내라는 것이다.
어라? 이 영감 봐라--부랑자는 속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선뜻 내놓을 오푼은 아니었다.
『예! 사실 그 오푼은 이따가 저녁 사먹으려고 남겨둔 겁니다.』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어서 술이나 사 주구려! 젊은이가 보기보담 인색하구먼!』
영감이 넉살좋게 이렇게 말하니 부랑자는 기가 막혔지만 대접을 안할 도리가 없게 돼버렸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랑자로부터 오푼 어치 술을 빼앗아 먹은 늙은이는 한참을 신나게 마시더니 어지간이 기별이 왔는지
『어 이제 그만하면 살겠다.』하더니
『젊은이는 어디까지 가쇼?』했다.
『네! 안동고개까지 갑니다.』
『어 그래? 그럼 나하고 동행하게 되었구먼! 나도 안동까지 가는데…자 이젠 떠나 보자구 어두어지기 전에.』하고 자릴 털고 일어섰다.
이 바람에 덩달아 자리를 뜬 부랑자는 길을 걸으면서도 공연히 늙은이한테 기가 죽은듯 연상 쩔쩔맺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남의 주머니 돈이 얼마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또 공짜 술을 얻어 먹으면서도 시종 비굴한데가 없이 어엿한 태도를 하고 있으니 자연히 이 늙은이는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하고 여겨졌던 것이다.
『젊은이의 저녁 값으로 내가 술을 먹었으니 저녁은 내가 삼세!』
늙은이는 얼마쯤 걷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던 시키는 대로만 하시요』
하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릴했다.
어느 마을로 들어섰을 때였다.
저녁을 짓는 연기가 이 집 저 집에서 뭉게뭉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늙은이는 느닷없이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것같이 보이는 집 앞에 가 섰다.
『이리 오너라!』
소슬대문을 향해 노인이 두어 번 소릴 치자 대문이 열리면서 하인인 듯 싶은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하루밤 유하고 갈까하니 안에 가서 여쭈어 주십시오!』
늙은이는 부랑자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제맘대로 이렇게 말했다.
하인은 난처한 듯
『끌쎄 평상시 같으면 되겠지만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어떻든 기다려 보십시요!』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주인 남자인 듯 풍신 좋은 오십객이 나타났다.
『모처럼 오신 손님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별안간 집안에 우환이 생긴 바람에 부득이 손님들을 모실 수 없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십시요!』하면서 주인은 돈 한양을 내 놓으며 다른데 가보라고 했다.
노인은 주인이 주는 돈을 넌즈시 받아 부랑자에게 넘겨주면서 주인을 향해
『그거 안되었읍니다. 내가 약간의 맥을 짚을 줄 아는데 한번 봐 드리면 어떨까요?』하고 말하니 주인은 갑자기 눈물을 주루루 흘리며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죽은 사람의 맥을 보아선 무얼 합니까?』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다.
『아니 죽다니 그럼 초상이 났다는 말입니까?』
『글쎄 그렇게 되었읍니다. 잘 놀던 아이가 별안간 아프다고 들어오더니 의원을 부르고 어쩌고 할 틈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읍니다.』
『원 그럴수가……그럼 죽은 지가 얼마나 되었읍니까?』
『한시간도 채 못되었읍니다.』
『어디 내가 한 번 볼 수 없소? 한 시간이라면 아직 살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니……』
이 말에 주인은 새삼 노인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들어오라고 했다.
병풍이 둘러진 방안에는 방금도 사람이 울고 간 자취가 남아있었다.
병풍을 치우니 열살 미만의 예쁘장한 사내아이가 그린 듯이 눈을 감고 이불에 누워 있다.
노인은 맥을 짚고 눈을 까 보고 하더니 부랑자에게
『여보게 자네 마당에 나가서 장닭 한마리 잡아오게. 이 아이는 소생시킬 수 있네!』하고 말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내 커다란 장닭을 잡아 가지고 왔다.
노인은 부랑자에게 닭의 목을 베라고 하면서 어린애의 입을 벌렸다.
이윽고 닭의 생피를 어린애 입안으로 흘려 넣고 몇 분이 지나자 어린애는 몸을 비틀면서
『컥!』하고 죽은 핏덩어리를 뱉어내더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노인 말대로 어린애가 소생한 것이다.
『이 닭을 삶아서 미음죽을 끓여 먹인 다음 생강즙을 내 먹이고 한숨 푹 쉬게 하면 아무런 탈이 없을 것이오!』
노인이 말하자 집안은 별안간 떠들썩해졌다.
『노인장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해주셨으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백배 치사하면서 기적 같은 일에 어떻게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랑자와 함께 융숭한 저녁대접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얼마 후 그 사내애가 들어와 노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노인은
『네가 아까 피리를 불었지?』하고 물었다.
소년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 노인은 그랬을 것이라면서 그 피리를 가져오라 했다. 그리고는 소년의 일거일동을 보기나 한듯이 풀이했다.
『원래 이 피리는 오래 쓰지 않고 아무 곳에나 팽개쳐 놨던 것인데 자연히 습기가 차자 지네란 놈이 피리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요! 그것을 이 애가 모르고 입에 대고는 분다고 숨을 내뱉지는 않고 들어마신 까닭에 지네가 입안으로 들어가 목구멍 천장에 착 달라붙었기 때문에 기절했던 것인데 지네는 닭하고는 상극인 까닭에 그 피를 넣었던 것이며 까만 피를 쏟은 것은 지네가 닭피에 녹아서 나온 때문입니다.』
이 말에 주인과 소년이 아연한 것은 물론 부랑자까지 노인의 말에 놀래고있는데 노인은 다시
『첫눈에 주인장의 얼굴에서, 이 분은 어머니에게 대한 효도가 지극한 분이며 그 까닭에 하늘이 감동하여 늦게나마 득남하는 복을 얻었으리라 여겨졌고 또한 아이의 수가 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요!』하고 말하니 주인은 더욱 놀라와 했다.
다음날 아침, 노인이 떠나려 하자 주인은 막무가내로 노인을 며칠 쉬고 가게 하려고 했지만 노인이 구지 가려 들자 주인은 재산문서 한다발을 꺼내오며
『우리 집안에 멸문지화를 모면토록 하여 주셨으니 재산을 반분하여 고마움에 보답하겠읍니다.』하고 선뜻 문서를 내 놓았다. 노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주인은 할 수 없다는 듯 오천 냥의 어음을 내놓으면서 받기를 원하자
『꼭 그렇다면 천냥 짜리 어음 한 장만 주시요.』하고 천냥 어음을 받아 주인하고 헤어진 다음 그 어음을 다시 부랑자에게 맡기고는 스쩍스쩍 걸어가니 부랑자는 공연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알지도 못하는 처지에 오푼 어치 술 받아 준 일밖에 없는데 노인과 함께 있는 새 노인의 귀신이 곡할 재주를 보았고 거기다 거액의 돈까지 맡기니 어쩌자는 속셈인지 알 수가 없어 헤어지자는 말조차 못하고 쫓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보아하니 젊은이는 안동길이 그리 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 나하고 두어 군데 더 들렀다 가도록 하세. 그래도 괜찮지?』
길을 걷다 말고 노인이 이렇게 남의 속을 들여다보듯 말하니 꼼짝을 할 수 없게된 부랑자는
『예! 뭐 그리 급하지는 않읍니다.』하고 말해 버렸다. 그러자 노인은
『그렇다면 좀 길을 돌아서 가세!』하며 세 갈래 길에서 어느 한 길로 접어드니 안쫓아 갈 수 없게 된 부랑자였다 이렇게 걷기를 한나절쯤 해서 한 술 팔고 밥을 파는 어느 주막 앞에 당도하게 되었다.
허자 노인은
『자네 술, 한 사발 마실 생각 없나?』했다. 마침 목도 말라오던 참이라 그렇다고 대답하니 노인은 그 주막집을 가리키며 먼저 들어섰다.
마침 주막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주모만이 술을 걸르고 있었다.
주모는 어지간한 미인이었다.
노인은 대뜸 주모 앞으로 다가서며
『술 두 잔만 내시요.』하고는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술장사 십년 만에 주인댁은 돈푼이나 모았소 그려!』하고 엉뚱한 수작을 붙였다.
『영감님이 뭘 좀 아시는 모양이네요』
주모도 싫지 않은지 말대꾸를 했다.
『아무렴! 내가 좀 알긴 알지! 주인댁이 올해 서른 여섯이지?』
『아이 잘못 보셨어요. 서른이에요!』
『허어 거짓말하면 못써! 남은 다 속여도 난 못 속이지! 남들에겐 서른이라지만 사실은 서른 여섯에 생일은 동짓달 초엿새에 난 시간은 술시, 어때 그래도 아니라고 우길텐가? 늙은이를 속이면 못써!』
그러자 주모는 깜짝 놀라는 듯 눈을 동그렇게 뜨고는
『아니 어떻게 그리 잘 알아 맞추세요?』하고 신통하다는 표정을 짓자
『뭐 그것만 아는줄 아나? 사람의 길흉화복도 맞춰내는데…어떻든 주인댁이 당해야할 오늘밤 큰 일도 알지!』하였다. 그러자 주인여자는 큰일이라는 말이 더욱 놀라면서
『무슨 큰일이 있어요? 그럼 좀 아르켜 주세요!』하며 교태를 보였다.
|
|
'IT > 옛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역사속의 이야기 - 김유신 (0) | 2018.11.25 |
|---|---|
| 옛 이야기(고전) - 석상의 화신 下 (0) | 2018.11.23 |
| 옛 이야기(고전) - 태종의 맏아들 양녕대군 (0) | 2018.11.21 |
| 옛 이야기(고전) - 애란의 비련 (0) | 2018.11.20 |
| 찾는 차사는 살아 돌아가지를 못하였다.(옛 이야기(고전) - 함흥차사) (0) | 201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