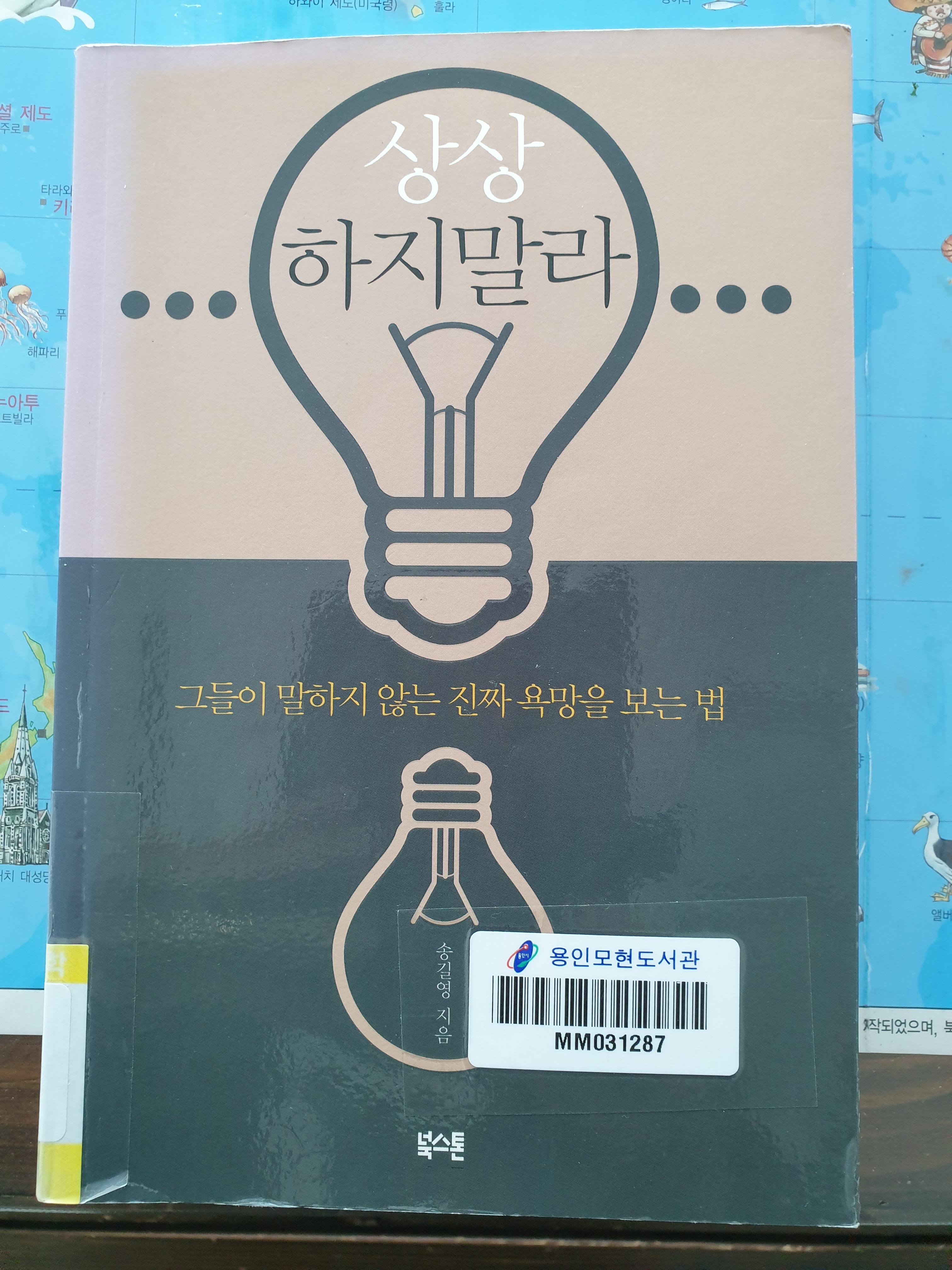
한 번은 포털사이트에 '카페'라고 입력해서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보았다. 온갖 종류의 카페 사진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게 카페야?' 싶을 정도로 허접한 곳도 적지는 않았다. 사람들에게 그 사진들을 몇 장 보여주면서 여기 커피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냐고 물어보니, 신기하게도 비슷한 가격대를 말했다. A카페는 2000원, B 카페는 3500원이 평균인데 C 카페는 6000원 정도 할 것 같다고 하고, D 카페는 2만 원을 받아도 고맙다고 했다. A 카페에서는 커피값을 3000원만 불러도 화내던 사람들이 왜 D 카페에서는 2만 원도 감지덕지일까? D는 사진으로만 척 봐도 고급 호텔 커피숍임에 분명했다. 탁 트인 통유리 너머로 그림 같은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2만 원이 대수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 카페에서 5000원이 커피값이라면 나머지 1만 5000원은 경치 값인 셈.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척 보면 안다는 것이다. 누구나 어느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으로 재화의 적정가를 정하곤 한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우면 가격이 비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종업원 옷차림이 세련되고 단정해도 머릿속 가격이 올라간다. 종업원이 웃고 있으면 점수를 더 준다. 심지어 테이블 간격이 넓어도 이 가게는 비싸겠다고 짐작한다. 여기에 천장의 높이, 커피향의 농도, 진열장의 크기와 조명, 메뉴판의 색상과 글자체까지 온갖 것들이 가세한다. 한마디로 처음 들어설 때 경험한 모든 감각의 총합이 그 카페의 '분위기'로 구체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카운터까지 걸어가면서 얼마의 금액이 적당할 것인가를 가늠한다.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모든 감각은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출발해 수많은 정보를 뇌에 전달한다.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빅 데이터'가 아니겠는가. 이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느껴진' 분위기를 전달하고, 슈퍼컴퓨터인 우리의 뇌는 지난 세월에서 얻은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기반으로 복잡한 계산을 해 메뉴판의 금액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해낸다.
이런저런 계산 끝에 '여기 커피는 6000원' 이라고 짐작했는데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5500원이면 만족스럽고, 4500원이면 감사하다. 반대로 후줄근한 매장에서 5000원을 받으면 화를 내며 도로나온다. 이런 판단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나 할까. 나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모이면서 나름의 객관적인 적정선이 형성된다. 어느 매장에 가든 비슷한 사회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비슷한 가격대를 추측해낸다. 사람들의 인식은 각자 주관적이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모둠인 사회에서는 인식의 공유와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의 객관적인 주관이 형성된다. 이를 우리는 '상식'이라 부른다.
우리는 흔히 상식이라 하면 갑남을녀의 통념이니 누구나 안다고생각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상식이란 것은 생각만큼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 대중의 보편적 이해와 궤를 같이해야 하는 데다, 상식도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나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으니 1만 원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은 3000원짜리 커피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다소 비싸더라도 조용하고 오래 있을 수 있는 북 카페가 잘되기에 나도 따라서 차렸는데, 이제는 저렴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유행이 바뀌었다면?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시도한 '인생 2막'은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힌 생각이나 한물간 통념을 '상식'이라 부르는 것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상식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변화하는 상식을 계속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흔히 '전문성'이라 쓰고 '감'이라 읽는 그 능력 말이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통찰력 insigh'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성 혹은 통찰력이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